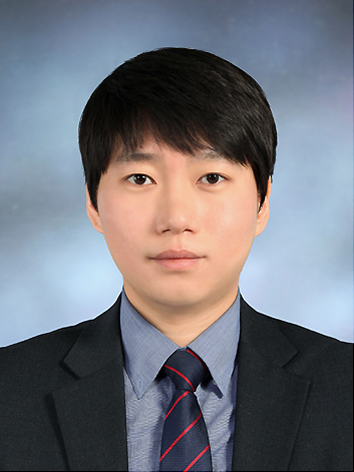
[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 A씨와 B씨는 물품거래 계약을 맺고 A씨는 물품을 바로 납품하고 B씨는 한달 뒤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금지금일이 다가오던 중 B씨가 살던 지역에 갑작스런 폭우가 내려 홍수가 발생했다. B씨는 큰 재산피해와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처지가 됐다. B씨의 사정을 모르던 A씨는 대금지급일에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했고 약속한 날 B씨에게 물품대금을 받으려고 하자 정부가 갑자기 개입해 재난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B씨에게 A씨가 물품대금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대금을 나중에 받거나 조금만 받을 것을 압박했다.
과연 위와 같은 사적거래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 도가 넘은 정치·정부개입 행위를 허용하는 입법 논의가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른바 ‘은행빚 탕감법’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은행빚 탕감법은’ 지난 2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차주의 대출금을 감면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영업이 제한되거나 영업장을 닫은 차주, 소득이 감소한 차주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에게 대출원금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사업주의 도산에 따른 실직자 확대, 빈부격차 심화 등을 막아야 한다’며 제안 이유를 들었다.
해당 법안이 거대여당의 횡포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은 “(은행법 개정안은) 이제 막 전체회의에 상정됐을 뿐이고, 법안소위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은 법안”이라며 해명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9월 MBC 라디오에 출연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은행들의 이자감면 제도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은행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니까 수입구조가 괜찮으니까 은행이 고통분담의 주체로 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는데 은행들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그의 인식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은행빚 탕감법’이 만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과잉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은행들은 사회적 역할을 자율·타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예컨대 은행권은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해 자율적으로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최근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경영이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 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고 점차 재무적 성과 뿐만 아니라 비(非)재무적 성과가 기업의 승패에 중요해지는 만큼, 굳이 입법을 통하지 않아도 금융사들이 스스로 생존과 경쟁을 위해서 사회적 역할을 확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입법으로 이를 강제하게 되면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은행들은 상환이 가능한 차주들만을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해 오히려 저신용자들의 대출은 문턱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은행들은 언제 정부의 빚탕감 압박이 올지 모르는 환경에서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원금 탕감과 변제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다루는 게 맞다. 또한, 재난으로 긴급하게 보호해야 할 취약계층이 있다면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 즉 민간기업에게 피해를 감수하라고 압박할 것이 아니라 긴급하다면 재정을 투입하면 될 일이다.
불법 추심을 일삼는 악질 채권자는 비판 받아 마땅하고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열심히 빚을 갚는 선량한 채무자들을 바보로 만드는 사회는 지양해야 한다. 다윗이 골리앗의 돈을 안 갚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